티스토리 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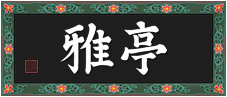
정해년 3월 23일에 새 정자[亭]를 낙성하였으니, 이름하여 '아정(雅亭)'이다. 본래 암파소(岩破所, empas)에 운암(李雲) 이공[李公德武]의 생전 거처가 있었는데, 이 역시 '아정'이라 불렀다. 그러나 세 칸[三間] 초가(草家)의 모습을 띄고 있었으므로, 오늘날 정자를 지어 낙성한 것을 두고 '이건(移建)'이라 하지 않는다.
갑신년 9월 초6일에 운암 이공이 졸(卒)하자 공의 백씨(伯氏)인 경재(景齋) 이공[李公德文]이 초가를 맡아 머물렀고, 을유년 7월 28일에 나 하은(河銀)에게 물려주었다. 그러나 초가 주위가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세가 험하고 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구한 계책을 펼 곳이 되지 못하기에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아 정자를 짓게 되었다. 그리하여 길지(吉地)를 구한 끝에 면남방담(綿南方談, tistory)의 한 켠에 지반을 다진 후, 여러 날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여 곧 십자형(十字形) 정자를 완공하였다.
'아정'은 아담한 정자라는 뜻이다. '아정'은 정묘(正廟) 연간에 규장각 검서관(檢書官)을 지낸 이덕무(李德懋, 1741-1793)의 호(號) 가운데 하나인데, 이 호는 '성시전도(城市全圖)'에 대해 공이 지은 백운시(百韻詩)를 정조(正祖) 임금께서 친히 평하시며 내린 글자 '아(雅)'에서 비롯된 것이다. 이아정(李雅亭)과 이운암(李雲巖)의 한글 이름이 동일한 것을 보면, 운암 이공이 당신의 초가를 '아정'이라 한 뜻에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다. 또 아정 이덕무가 남산(南山) 아래에 살았었는데, 지금 면남방담에 정자를 짓게 되니 '남(南)' 자가 걸린다. 이 또한 거듭 우연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.
'아담(雅淡)'은 고상하고 담백하다는 뜻이다. 조졸하고 산뜻하다거나 말쑥하고 담담하다는 의미도 있다. 그러나 고상하기는 하되 고지식해서는 안 되며, 담백하기는 하되 세상사에 완전히 담담해서도 안 된다. 자호(自號)를 짓든, 당호(堂號)를 받든, 기문(記文)를 청하든, 제목이나 글자가 좋은 것에만 만족한 채 조금도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. 무릇 '이름에 걸 맞는 실상이 있어야 한다'는 말이니, 이를 기억하기 위해 기문(記文)을 지어 남긴다.
정해(丁亥, 2007년)
4월 26일, 선성(宣城) 김하은(金河銀)
발(跋). 공지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삭제만 가능하여 부득불 다시 올린다. 임인(壬寅, 2022년) 추구월(秋九月) 초일일(初一日).
- [안내] 본 블로그 글(저작물)은 저작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복제·복사·게시·배포·전시·공연·전송 및 매체 전환, 포맷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(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범위의 인용 또는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따른 '인용'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)
- #이 글의 주소 : lembas.tistory.com/187
